겸손과 존중. 둘 다 절제의 미덕으로부터 발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겸손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숨김으로써 오히려 자신을 드러낸단 역설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자신을 숨긴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생각해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는 것을 좋아한다. 단지 그 수단과 빈도의 차이일 뿐 우린 은연중에 우리가 가진 우월함을 주변에 보여주며 살아간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화려한 수식언을 이용한 문장으로△말을 잘하는 사람은 재치있고 화려한 언변으로△춤을 잘 추는 사람은 자신만이 보여줄 수 있는 역동적인 동작으로 남들이 차마 넘보지 못할 방벽을 쌓아올린다. 내가 잘하는 것을 남에게 보여주는 행위 그 자체는 부정적으로 볼 여지가 없다. 그러나 내 행위의 저의(底意)가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닌 타인을 깔아뭉개기 위한 것일 때 문제가 생긴다. 사실 “인간도 동물이다”란 관점에서 보면 자신이 지닌 장점을 남에게 과시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마치 수컷 공작새가 길고 풍성한 허리깃을 펼쳐 주변에 위용을 과시하는 것 마냥 인간의 행위 또한 한 개체가 또 다른 개체인 인간을 제압하기 위해 자신의 재능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린 왜 이런 본능을 숨겨야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다. 우린 혼자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감으로써만 살아갈 수 있다. 만약 그 집단에서 모두가 각자 맡은 일을 하고 있을 때 자신이 가장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어떨까? 처음엔 모두가 그를 올려 볼 것이다. 그러나 곧 엄청난 명예를 얻은 그의 모습을 보고 그와 비슷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확산된 결과 만약 모든 구성원이 서로가 더 우월함을 강조하기만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사회는 어떠한 발전도 없는 정체 사회로 접어들 것이다. 소위 ‘누가 더 잘났는지’ 가리는 일에만 빠져 상호 의존이란 오래된 규범이 파괴되고 △시기△질투△혼란과 무질서만 남은 사회가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존중은 타인과의 연결을 견고하게 하는 접착제로 기능할 수 있다. 존중받는 사람은 방어보다 설명을 그리고 변명보다 협력을 선택하게 된다. 회의에서 말이 통하고 갈등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생기며 비난 대신 피드백이 오간다. 이때 집단은 ‘누가 더 우월한가’ 경쟁 대신 ‘어떻게 더 나아질까’ 협력에 에너지를 쓴다. 또한 겸손과 존중은 다양성을 성과로 전환시키는 변환기이다. 배경과 취향, 전문성이 다른 사람들이 모이면 충돌은 필연이다. 이때 겸손은 “내 관점은 전체의 일부일 뿐”이란 기본 전제를 세우게 하고, 존중은 “당신의 차이는 결함이 아니라 자산”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차이가 살아남을 때 혁신이 발생한다. 닮은 생각은 속도를, 다른 생각은 방향을 준다. 방향 없는 속도는 공회전이다. 겸손과 존중은 속도와 방향을 동시에 확보하게 하는 최소조건인 것이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왜 본능을 숨겨야 하는가?” 공작새의 깃은 번식기에만 펼쳐진다. 모든 순간 깃을 펼치면 포식자에게 들키고 스스로 지친다. 인간의 재능도 그렇다. 보여줄 순간과 덮어둘 순간을 구분할 때, 재능은 자원으로 남고 관계는 자산이 된다. 겸손은 타이밍의 감각을 존중은 경계의 감각을 준다. 이 두 감각이 합쳐질 때 우리는 ‘누가 더 잘났는지’의 게임을 접고 ‘어떻게 더 잘될지’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
결국 겸손과 존중은 우리 각자의 품격을 지키면서 공동의 성공 확률을 높이는 이기적이면서도 이타적인 최적해다.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스스로는 고개를 숙이고 타인의 존엄에 작은 자리를 내어주는 연습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승원(외대학보 편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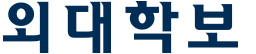

 즐겨찾기 추가
즐겨찾기 추가



